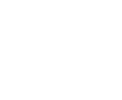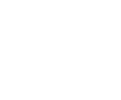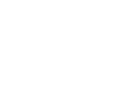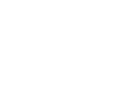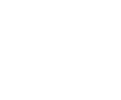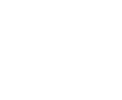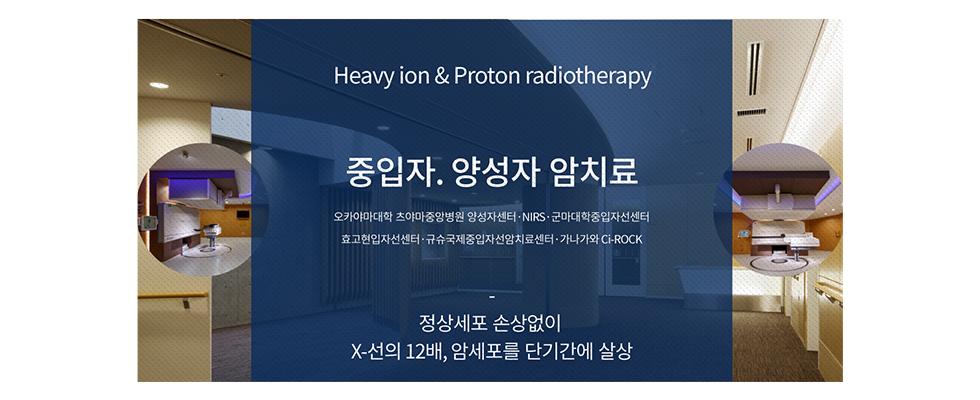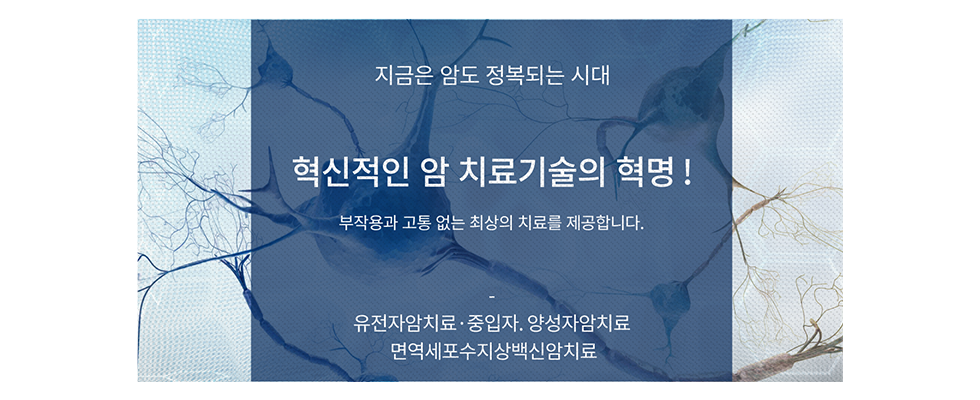‘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의 대부… 한훈 박사
“Mother, I moved my toes. I moved my toes!”
(엄마,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2005년 11월 말 한국의 한 대학병원. 미국 여성 미셸 파라(Michelle Farrar)는 미국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내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발가락 움직이기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당연하고 간단한 일이지만 하반신마비 환자에게는 꿈 같은 일이다.
2003년 9월까지만 해도 미셸은 승마를 즐기던 활동적인 여성이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으로 실의에 빠진 그에게 한국 생명공학 연구진(한훈 박사)의 척수장애인 줄기세포 치료 뉴스는 한 줄기 빛이었다.
한국의 연구진에게 연락을 취한 미셸은 그로부터 두 달 뒤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적합한 줄기세포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희망의 땅’ 한국으로 향했다. 그리고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 수술이 진행됐고 하반신에 감각이 돌아와 보조기구를 이용해 걸을 수 있게 됐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미셸의 이야기는 ABC TV를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됐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성서(Bible) 속 이야기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훈(59) 박사는 이 꿈 같은 일을 현실로 앞당긴 인물이다. 한 박사는 면역유전학을 전공한 연구 의사였다. 가톨릭대학 교수 시절 그는 혈액종양 치료에 필요한 골수를 확보하기 위해 골수은행을 만들며 연구에 매진했다. 1998년 골수이식에 관한 한편의 논문을 본 후 한 박사의 연구는 일대 전환을 맞는다.
이 논문에는 타인 간 골수이식에서 조혈모세포(피를 만드는 줄기세포)가 간(肝) 세포로 분화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포함돼 있었고, 한 박사는 ‘골수에 줄기세포가 있다면 발생학적으로 훨씬 빠른 탯줄혈액(臍帶血ㆍ제대혈)에도 줄기세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대혈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연구에 필요한 제대혈을 확보하기 위해 산부인과의 협조를 받아 제대혈은행도 마련했다. 한 박사는 2000년에 우연히 찾은 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얻는데 성공하며, 자신의 생각을 사실로 확인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제대혈에는 줄기세포가 없다는 게 정설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쥐와 토끼, 개를 대상으로 대량의 실험을 진행했고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2003년 한 박사는 동물실험을 통해 확보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환자를 상대로 한 임상연구에 착수했다.
1년 뒤 19년 동안 하반신이 마비돼 걸을 수 없었던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데 성공했다. 2004년 11월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치료 성공 기자회견에서 이 환자는 보조기구에 의지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이후 한 박사는 세계 의학계와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고, 현재까지 제대혈 줄기세포 연구과 치료에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2003년 자신의 연구 성과를 환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학교를 나온 그는 생명공학 전문기업인 히스토스템을 설립하며 경영인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평생 의학 연구만 하던 그에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2010년 코스닥 시장 입성을 위해 퓨비트를 인수ㆍ합병한 뒤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며 1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난 2일, 재도약을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한 박사를 만났다. 그는 난치병 환자 치료를 위한 탯줄혈액 줄기세포 전문병원 개원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난치병 치료는 ‘완치’가 아닌 ‘호전’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줄기세포의 보고(寶庫) ‘제대혈은행’은 한국의 경쟁력
◆생명공학은 휴머니즘 산업… 인간 존중이 우선 돼야
― 병원은 언제 개원하나
“준비는 끝났다. 이제 간판만 바꿔달면 된다.”
― 이곳에서는 어떤 질환을 치료하나
“주로 신경계통 난치병이다. 자폐증, 파킨슨병, 혈관성 치매가 주가 될 것이지만 다른 난치병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줄 것이다.”
― 자폐증도 치료가 되나
“자폐증 여러 케이스를 치료했다. 최근에는 자폐증이 있는 17세 남학생을 치료했는데 대학에 합격해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 2005년 황우석 박사 사태로 줄기세포란 단어는 널리 알려졌지만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줄기세포는 어떤 종류가 있나
“줄기세포는 크게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로 나뉜다. 배아줄기세포란 초기 분열 단계의 배아(胚芽·정자와 난자가 수정 후 장기와 조직 등으로 분화되기 전 세포)에서 채취한 세포로, 모든 종류의 장기와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세포다. 그러나 왕성한 분화 능력 때문에 진행되면 종양을 형성한다. 때문에 난치병 치료보다는 연구에 적합하다.
반면 성체줄기세포는 제대혈이나 성인의 골수, 혈액 등에서 추출해낸 세포로, 구체적인 장기 세포로 분화하기 직전의 원시세포를 뜻한다.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증식력이 약하고 분화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역시 이를 이용하면 손상된 장기나 조직의 세포를 유지, 복원할 수 있다.”
― 다른 성체줄기세포도 많은데, 왜 제대혈을 선택했나
“제대혈에는 백혈병을 치료하는 농도가 짙은 조혈모세포가 들어있다. 처음에는 혈액병에 필요해 제대혈을 연구했는데 그러던 중 줄기세포를 발견했다. 줄기세포는 분화하면 면역반응(거부반응)이 생기므로 분화하기 전의 원시세포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제대혈을 제외한 성체줄기세포는 타인의 것에 면역반응을 일으켜 대부분 자신의 것을 쓰지만 제대혈 줄기세포는 타인에게 이식해도 면역반응이 없고 안전하다.”

제대혈은 영하 196도 액화질소 탱크에서 냉동 보관한다. 한 박사의 제대혈은행에 보관된 80개 탱크의 제대혈은 혈액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8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양이다. Getty Images
― 제대혈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동하나?
“줄기세포는 환자의 세포 중 약한 곳으로 가서 흩어진다. 그리고 환자의 세포와 바로 뭉친 후 손상된 조직의 기능을 돕는 단백질을 분비해 치료하며 서서히 건강한 세포로 교체한다. 퓨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보통 30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난다.”
― 제대혈 줄기세포는 어느 부위에 어떤 방법으로 이식하나
“기본적으로 병이 있는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게 원칙이다. 예를 들면 척수마비 환자의 경우 척수 신경을 노출시켜 직접 줄기세포를 넣는다.”
― 지금까지 몇 가지 질환을 치료해봤나
“2000명 정도 치료했다. 뇌기저동맥 파열, 척수 손상 마비, 루게릭병, 버거시병 등 한국인에게 흔한 난치병은 거의 모두 치료해봤다. 아마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은 거의 다 해본 것 같다.”
― 치료 후 완치된 사례가 있나
“난치병 치료는 ‘완치’란 개념보다 ‘호전’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지금까지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치료된 케이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호전됐다. 조금씩은 좋아진다.”
― 부작용은 없나
“없다. 간혹 아주 예민한 환자의 경우 제대혈 줄기세포가 다른 세포를 활성화시켜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다.”
― 줄기세포를 얻는 제대혈은 어디서 구하나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여제대혈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신생아의 태반 혈액인 제대혈은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 서울 시내 200여 곳의 산부인과에서 도움을 줬다.”
― 보관은 어떻게 하고, 현재 몇 개나 보관돼 있나
“영하 196도 액화질소 탱크에서 냉동 보관한다. 탱크 하나에 1500유닛(개)이 들어간다. 이런 탱크가 80개 있다. 현재 12만 유닛 정도 있다. 연구에도 쓰고 환자 치료에도 사용한다. 골수은행은 기증자의 유전자 데이타만 저장하면 되지만 제대혈은 실물이라서 보관상 유지비가 많이 든다.”
― 유지비는 외부 지원을 받았나
“자비로 했다. 차츰 규모를 키우면서 자금이 많이 들더라. 제대혈 줄기세포로 치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제대혈은행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 12만 유닛으로 몇 명 정도 치료할 수 있나
“다른 질환은 좀 복잡하고, 혈액질환의 경우 8만 명 정도 치료할 수 있다.”
― 전 세계에서 한국의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이 세계 최고다. 세계적으로 제대혈 줄기세포로 치료한 논문이 7개 발표됐는데 모두 내가 관여한 것이다.”
― 왜 다른 나라는 제대혈 연구에 미진한가
“우선 연구할 제대혈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제대혈을 기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자기 것을 보관한다. 미국의 경우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발한 연구를 할 수가 없다. 어찌보면 공여 제대혈은행이 한국의 경쟁력이다.”
― 제대혈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에 대한 외국의 반응은 어떤가
“이미 관심이 많다. 세계 최초 논문들만 모아 신속하게 발표하는 ‘저널 오브 메디컬 케이스 리포트(Journal of Medical Case Report)’라는 온라인 학술지에 2011년 내 논문이 발표됐다. 이후 이메일 한통이 왔는데 3개월 동안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내 논문을 봤다며 앞으로도 자신들의 학술지에 발표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이외에도 해외 강의 요청도 많다. 중동의 한 나라에서는 의과대학과 연구소를 만들고 있다며 고액 연봉을 제시하기도 했다.”
― 제대혈 줄기세포는 난치병 치료에서부터 미용에 이르기까지 적용 범위가 넓은 것 같다
“이미 시중에는 피부세포의 재생과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제대혈 화장품이 인기다. 우리도 대머리 치료제와 제대혈 줄기세포 성분이 다량 포함된 화장품을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싶다.”
― 개발한 신약은 어떤 질환을 치료하게 되나
“이곳 서울스템센터에서 치료하는 질병을 위주로 개발하려 한다. 줄기세포의 물질들은 이미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신약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지만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 제대혈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의 종류와 효능은 이미 분석이 끝난 상태다. 조금 더 집중하면 신약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 대학에서 난치병 치료 연구를 하던 과학자가 회사를 차려 경영자가 됐다. 대학은 왜 그만뒀나? 이후 힘들지 않았나
“제대혈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하려면 제대혈은행이 들어갈 수백평의 공간과 자금, 인력이 필요했다. 대학이 나 한 사람을 위해 지원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나왔다. 바이오산업은 수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인간의 생명이 걸린 분야라서 기본적으로 타인을 돕는 휴머니즘이 있어야 한다. 아마도 일반 상경계통이나 MBA를 졸업한 사람들은 힘들 거다. 바이오산업의 경영자는 그 계통을 전공하고 경영에 재능이 있으며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 국내 최초로 제대혈은행을 설립해 줄기세포 산업의 기반을 다진 인물로 의학계에서 존경을 받아왔다. 이를 가능하게 한 힘은 무엇일까
“가톨릭대학교 조교 시절 한국의 연구 환경에 힘들어할 무렵 지도 교수님이 나를 위해 미국 유학길을 터주셨다. 그 은사님의 도움으로 UCLA에서 연구할 수 있었고 좋은 성과도 냈다. 1982년 UCLA에서 우리에게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며 현금이든 뭐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다. 그때 은사님은 돈은 받지 말고, 연구에 필요한 기계와 시약으로 받으라고 지시하셨다. 나는 그 은사님의 학자적인 양심을 존경한다. 이 양심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지금까지의 나를 이끌지 않았나 생각한다.”
한훈(韓薰) 박사
*가톨릭의대 교수(1979∼2003)
*가톨릭의대 제대혈은행장(1996∼2003)
*가톨릭 중앙의료원 조혈모세포은행장(1994∼2002)
*한국생체재료학회 부회장(2003∼2010)
*한국생체재료학회 회장(2010∼2012)
*아시아CORD(아시아 제대혈 연합회) 한국대표(2000∼현재)
*㈜히스토스템 대표(2002∼2012)
*히스홀딩스 고문(2012~현재)
*서울스템센터 대표(2012~현재)
- 티시바이오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5,16층(우신빌딩) | 대표전화 1644-8475 | 대표이사 이상우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지은
- Copyright © 2017 TC bio 티시바이오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